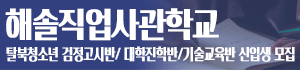|
조숙 경북 동부하나센터 이탈주민전문상담사 두만강 발원지를 찾는 것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다. 중국인이라 말이 통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원래 입이 무겁고 성실해 보이는 운전사는 끝없이 이어지는 자작나무와 낙엽송 숲길을 묵묵히 운전해갔다. 끝이 없을 것 같이 막막한 숲길에서 드디어 차가 멈추어 섰고 ‘두만강 발원지’ 라고 높다랗게 달린 표지판이 보였다. 강의 발원지는 작은 웅덩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전에는 그 곳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데 지금은 중국의 영토라는 것만 강조하듯 붉은 별을 단 철문이 굳게 잠겨있었다. 강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길고 긴 철조망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임을 선명하게 알려줄 뿐 두만강 물길에서 강 같은 평화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시월의 강물이 따뜻할 리 없지만 내가 만져본 두만강 물은 섬뜩하리만큼 차가웠다. 이렇게 차가운 강물에 알몸으로 건너왔다고 하던 그녀가 생각났다. 옷을 발가벗고 저 강을 건넜다고 했다. 젖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탈북자라고 생각해서 신고 당할까봐 아예 알몸으로 건넌다고 했다. “추석전날로 도강하는 날을 잡았지요. 북한에서 추석은 크게 명절의 의미가 없어요. 고난의 행군전에는 그래도 추석명절이라고 색다른 몇 가지 음식 마련해서 이웃과 나누기도 하고 성묘도 가곤 했는데 지금은 형편이 더 나빠져서 추석이라고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성묘 가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추석전날로 도강하는 날을 잡은 것은 작업장이 며칠 쉬기 때문이죠. 엄마는 먼저 집안 소재를 깨끗이 했어요.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나중에 누가 와서 집안을 들여다보고 어질러져 있고 집기들이 내 팽개쳐 있으면 더러운 여편네라고 흉 볼 거라면서 나에게 뒷마당을 싹싹 쓸어놓고 몇 개 안되는 양은 냄비도 박박 문질러 닦으라했어요.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집안을 청소했어요. 작은집 언니들이 그때 머리카락 치렁치렁한 처녀들이었는데 국경지역 경비서는 남자애가 작은집 언니를 연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족이 도강하는데 도움을 줬어요. 날짜를 그 남자애가 경비서는 날로 잡은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우리엄마와 아버지와 언니 그리고 나 네 식구가 탈북결심을 했어요. 일찍 저녁밥을 해먹고 집을 나섰어요. 검은 옷과 검은 푸대 자루를 제일 먼저 챙겼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상하게 다시 못 돌아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집을 한번 뒤돌아 봤는데 왜 그렇게 작고 초라하게 보이던지. 강둑에 엎드려서 그 남자애가 경비 교대 할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느님이 도와 줘서 추석 전날인데도 날이 흐려서 달이 구름사이에 숨었다가 나왔다가 했죠. 달이 구름사이로 들어가면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가 달이 조금만 구름 속에서 나와도 주변이 대낮같이 밝아지는 느낌이었지요. ‘달아 제발 나오지 마라’고 빌고 빌었어요.” 처음엔 알몸으로 건널 계획이었는데 엄마가 먼저 발가벗고 보니까 너무 살색이 희어서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알몸에 준비해간 검은 보자기를 머리까지 뒤집어썼어요. 나는 그때 탄광에서 일을 했는데 석탄먼지가 얼굴에 얼마나 달라붙는지 마스크 낀 얼굴을 보면 누가 누군지 분별이 안될 만큼 탄가루가 두껍게 달라붙어요. 일을 마치고 나면 작업장에 씻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순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막상 내 차례가 오면 대충 씻고 말죠. 그러다 쉬는 날 되면 작정하고 밤에 두만강가로 나와서 박박 문질러 씻어요. 손톱 밑에 낀 탄가루는 그래도 잘 지워지지 않아요. 여자로서 수치지요. 다른 집 딸은 부모 토대가 좋아서 금 캐는 작업장에 배치 받기도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면서 금 캐는 작업장 여자들은 깨끗해요. 피부도 더 뽀얀 것 같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자기 손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만져보았다. 거칠고 힘든 탄광 일을 한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희고 부드러운 손이다. “손이 이쁜데요 뭐~” 하는 내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손이 고마운 손이지요. 이 손으로 중국에서 살 때 국수를 말아 팔았어요. 매일 하얀 밀가루만 만지니 북한에 있을 때 시커멓게 탄가루가 박혀있던 손이 하얀 밀가루를 만지는 손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남한에 와서는 뜨거운 물 틀면 펑펑 쏟아지니 요새는 손이 호강을 해요.”한다. 어둡고 암울했던 과거로 대변되는 검은손과 밀가루 묻어 하얀 손 지금 매니큐어 바른 반짝반짝한 손이 그녀 인생의 변천사를 말해주는 것 같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강을 건널 때 언니와 내가 같이 허리를 묶었어요. 그런데 강 중간 쯤 오니까 물살이 너무 세게 흘렀어요. 맨 날 보던 강이라 쉽게 건널 줄 알았지요. 강 중간쯤 오니까 강물이 내 키를 넘는 거예요. 중국에서 온 브로커와 엄마가 먼저 강으로 들어갔죠. 오 분 쯤 있다가 나와 동생이 허리를 단단히 묶고 강물 속으로 발을 집어넣었어요. 섬뜩한 기분이 들더라구요. 순간 움찔했죠. 동생은 깜짝 놀라서 한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내어 앞장서서 동생을 강물 속으로 끌어 당겼죠, 동생이 순순히 끌려 강물 속으로 들어왔어요. 뒤이어 십분 후에 아버지가 들어오기로 했죠. 한꺼번에 넷이서 움직이면 발각되기 십상이라고 아버지가 생각해 낸 것이었어요. 강 중간쯤 동생과 내가 건너는데 그만 강바닥에 움푹 파인 부분에서 내가 발을 헛디뎌 빠지고 말았어요. 강물 따라 내 몸이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앞에 가던 동생도 같이 떠내려 왔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싶어서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발끝을 세워 강바닥에 서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겨우 발끝으로 강바닥을 딛고 서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끝에 힘을 주고 서 있는데 탕~하고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악~ 하는 아버지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몇 명의 군인이 달려왔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고꾸라졌어요. 나와 여동생은 강물 속에서 아버지가 거꾸러지는 것을 보고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발끝에 모으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구요. 흐르는 강물 속에 목만 내놓고 버티고 서서 북한 쪽을 한번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안내려고 어금니를 꽉 물고 강물 속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여기까지 얘기 듣고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녀도 나도 깊은 한숨이 동시에 나왔다. 그녀의 두 줄로 골진 미간이 한 곳으로 모아졌다. 머리카락을 걷어 올린 이마에 주름살은 없는데 유난히 미간 주름만 깊다. 깊게 패인 상흔 같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나이보다 들어보이게 한 것도 미간주름 때문이었던 것 같다. 자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알 수 없는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럴 때면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게 된다고 호소했었다. 나는 그녀의 치밀어 오르는 울화의 원인을 대충 짐작만 했었다. 그녀도 강을 건너는 꿈을 자주 꾼다고 했다. 강을 건너왔으나 다시 잡혀서 돌아간 어머니와 강변에 쓰러진 아버지의 환영이 잊혀 지지 않아서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다. 나는 집 앞에 흐르는 강 얘기를 들려주었다. “강과 바다가 합쳐지는 부분에는 황어가 살아요. 황어들은 산란하러 강을 거슬러 올라와요. 큰물이 지나가고 나서 물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황어들이 떼 지어 올라오는 게 보여요. 가끔은 물위로 튀어 오르는 날렵한 녀석도 있어요. 황어비늘에 반사되는 햇살이 금빛으로 반짝거려요.”그녀가 흰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나는 그녀의 슬픈 두만강에 눈부시게 반짝이는 황어를 풀어놓아 주었다. 육지는 누군가 먼저 모험이나 희생하면서 걷고 나면 길이 된다. 그러나 두만강은 먼저 건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길을 걸어 나갔지만 아무도 길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첫발을 내 딛는 걸음마다 섬뜩하고 진저리 쳐지는 물길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건너거나 건너지 못한 사람들의 숱한 눈물이 저리 시퍼렇게 한이 되어 흐르는 걸까? 두만강의 발원지부터 시작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만강가에서 아픔 없이 강 같은 평화를 노래하는 날이 아마도 이 여정이 끝나는 날이지 않을까싶다. (수필가)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