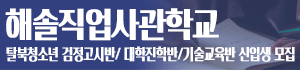별을 보며 출근하고 별을 보며 퇴근하는 쳇바퀴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 임박해서 11박의 유럽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다. 영화에서는 수십 번은 봤을 도시를 돌아본다는 건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런던에서다. 10여 명의 일행을 태운 관광 미니버스가 짐을 풀자마자 시내 관광에 나섰다. 버스는 얼마 가지 않아 도심 중앙에 서더니 구경하란다. 아름드리나무숲으로 싸여 있는 공원이었다. 파란 잔디에 군데군데 한가롭게 앉아 있거나 누어있는 시민들 모습뿐이었다. “음습한 날이 많은 런던에선 이렇게 화창한 날이면 시민들이 공원에 나와 햇볕도 쐬고 담소도 나누곤 합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고 행복해 보입니까” 넓은 공원에 파란 잔디가 탐스럽게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문득 주저앉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다. 성큼 들어가 신발을 벗고 벌렁 누었다. 눈부신 파란 하늘이 가슴에 안겼다. 저절로 눈이 감긴다. 곧 깊고 깊은 미지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내 평생 처음으로 온통 탐스러운 잔디로 덮인 정원을 본 곳이 경남 진해에 있는 대통령 별장이다. 벚꽃놀이 때면 개방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잔디가 그렇게 탐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40여 년 만에 런던에서 탐스러운 잔디로 뒤덮인 공원을 본 거다. 그동안 얼마나 메마르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됐다. 잔디가 뒤덮인 공원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그때 알았다.
“뭘 그렇게 넋이 빠지게 보고 있우?” (…혼자 오면 좋겠다...) “부러우면 당신도 곁에 가 눕구려” 얼른 잔디에 들어가 눕고 싶은 생각이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굳이 나이, 체격에 눌려 주눅들 필요가 있으랴 싶어 아쉽게 자리를 옮겼다. 공원에는 대여섯 살 되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잔디에서 뒹굴며 놀고 있었다. 선생인지는 멀찌감치 떨어져 보고만 있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벤치에는 할머니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산책길에는 대리모 여인들이 유아차를 밀며 지나갔다. 저쪽 뉴욕 박물관 벽에는 뉴욕오페라교향악단 연주가 주말에 공원에서 열린다는 현수막이 보였다. 며칠을 2달러짜리 버거로 점심을 때우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원에서 살았다. 누가 뉴욕이 시끄럽고 번잡하기만 하다고 할 것인가. 어렸을 적부터 서울 사직공원에서 놀았던 몸이다. 공원에는 풀이 있어 여름에는 헤엄을 쳤고 겨울에는 그 옆 언덕길에서 썰매를 타곤 했다. 어른이 돼서는 낮부터 우거진 남산공원 숲에 들어가 한때를 즐겼으며 신혼 초기에는 뚝섬공원에서 가족과 한껏 즐겼다. 하지만 그때 그뿐이었다. 뇌리에서 공원이 사라진 지 오래다. 푹신한 잔디가 깔린 편안한 공원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쩌다 공원에 가도 소가 뜯어먹은 것 같은 잔디에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술주정에 고성방가가 내쫓았다. “형, 공원에 나오니까 술 생각 안 나우?” 뉴욕에서다. 센트럴파크는 물론이고 근교 어느 공원에 가도 술은 절대 안 된다. 근사한 바비큐 시설이 있어도 음주는 절대 금지다. 딱 한 번, 그것도 대서양이 찰랑거리는 해변에서 술 한 잔 마셔 봤다. 아우가 USB 차 뒷문을 열어 저치고 앉으란다. 그리곤 봉투에 들어있는 술을 꺼내지도 않고 한잔 따라준다. 비치에서도 술은커녕 술병만 보여도 벌금이라 봉투 체 술을 따라 준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원이 없다. 술에 취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곳이 공원이다. 더위를 피해 가족이 공원에 나와도 아랑곳없이 술타령이다. 탐스러운 잔디에서 별이 보이는 하늘을 보려 하지 않는다. 별을 안 보니 꿈인들 있을 건가.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