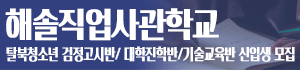이제는 거의 추억 속에 묻히고 만 얘기지만 무더운 한여름에 매미 소리 시원하게 우는 느티나무 그늘 밑 평상에 앉아 장기를 두는 한가함이야말로 도회지 사람들이 무척이나 부러워하던 정경이 아닌가 한다.
아침부터 푹푹 찌기 시작하는 한여름이면 할 일 없는 마을 노인들은 부채 하나 들고 느티나무 명당자리로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한다. 부지런한 노인들은 이미 장기판을 벌여 놓고 호기 있게 “장이야!” 소리를 외친다. 그러면 의례 옆에서 구경하던 노인들 입에서 한 소리 나온다. “외통이네, 외통!” “졌어, 졌어!” 그러지 않아도 번번이 지는 대머리 노인은 약이 올라 힐끔 노려봅니다. 그때 뒤쪽에 있던 점박이 노인이 한마디 한다. “외통은 무슨 외통이야. 포를 넘기면서 멍군 장군 불러. 그럼 이겨!!”
세상에 훈수 없는 일이 있던가. 자고로 훈수란 게 뺨 맞아가며 하는 거며 훈수 없는 짓은 세상에 재미없는 거다. 모르면 몰라도 훈수란 유구한 역사에 길이 남아 있는 인생 참견 중 으뜸가는 재미 중 하나가 아닌가 한다. 그런 훈수를 말린다고 말려지며 안 할 사람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훈수는 조선 팔도 곳곳에서 훈훈하게 벌어지고 있다.
요즘 대선에 출마한 당사자는 물론이려니와 각 진영의 캠프에서는 왼 종일 말 폭탄을 쏟아내느라 부산하다. 어느 진영이라 할 것 없이 사생결단이다. 당락에 출세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먹고 살길이 열리기도 하는데 어찌 사생결단으로 덤벼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서로 질세라 욕설에 가까운 말까지 섞어가면서 댓거리로 시장바닥처럼 시끌시끌하다.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배울까 봐 겁이 나기도 하지만 가다가는 웃지 못할 말도 서슴없다. 언론 매체에 나오는 대변인들 입을 통해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자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
“토론요? 그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토론을 피할수록 불리해지는 건 당신들 편입니다.” 자기 진영이 잘났다고 선전을 벌이는 거야 당연한 건데 가다가 갑자기 적이랄 수 있는 상대편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훈수를 두고 있는 꼴을 종종 볼 수 있다. 훈수도 가지가지이지만 상대에게 유리한 훈수를 두다니 아무래도 태생적으로 느티나무 추억이 깊은 민족이라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다.
밤잠을 설치는 심야에 손흥민이 출전하는 축구를 가끔 본다. 선수들의 발재간도 발재간이려니와 관중들의 응원 열기는 가히 스포츠의 열기를 느끼게 한다. 외국의 스포츠 관중의 응원 열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2002년 월드컵 때 말고는 우리의 응원 열기는 감히 견줄 바가 아니다. 그들의 응원은 광기에 가깝다. 콜레라는 함성에 도망이라도 갔는지 거리 두기도, 마스크도 행방불명이다. 앞니를 내밀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응원의 소리가 고막을 찢는다.
“볼을 윙으로 패스를 해!” “밀착 마크를 해야지, 붙어, 붙어!!” 응원은 훈수다. 이기려는 훈수이기도 하고 보는 재미를 더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이편저편 없다. 만약에 스포츠에 응원이 없다면? 관중 없는 운동장이다. 중학교 1학년 손주가 수학을 어려워한다. 초등학생 때는 제일 좋아한 과목인데 이상해 물어봤더니, “하부지, 피타고라스보다 수학 더 잘해?” 말문이 막힐 하부지가 아니다. “그럼!” 무슨 어림없는 소리냐는 듯 본다. “피타고라스는 컴퓨터도 못하잖아” “...?” “그러니 넌 수학을 잘 할 수 있어” 이 또한 멋진 훈수 아닌가.
훈수란 살아가며 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닌가 한다. 살아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그런 훈수를 못하게 막는다면 그 얼마나 재미없는 세상이겠나. 살며 훈수를 두는 재미가 얼마나 솔솔 한가. 올해는 벽두부터 신나게 훈수할 수 있는 대선이 있어 심심할 사이가 없어 좋다.
박신호 방송작가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