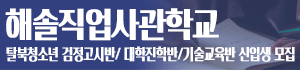|
조숙 경북 동부하나센터 이탈주민전문상담사 ‘발이 추워요’ 첫 대면 하는 날 그녀가 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다. ‘몸의 한 부분이 추위를 느끼는 것’은 ‘시리다’고 표현해요 라고 말했다가 나는 얼른 그 말을 거두어 들였다. 그녀에게는 ‘춥다’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았다. 그녀는 실제로 아주 춥다. 몸도 마음도 발도 춥다. 그녀가 처음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왔을 때 남한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지방에 정착하고 싶냐는 질문에 ‘춥지 않은 곳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인간이 느끼는 육체적 고통 가운데 배고픈 것 다음으로 추운 것이라는데 그녀는 배고픈 것 보다 추운 게 더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두만강을 건널 때였어요. 칠흑 같이 어두운 밤에는 강물도 검어요. 검은 강에 발을 집어 넣었을 때의 그 섬뜩한 느낌을 아세요? 온몸에 차가운 전율이 흐르는 것 같이 몸서리 쳐지는 일이죠. 나도 모르게 물속에 담갔던 발을 빼냈어요. 발만 잠깐 담갔을 뿐인데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때를 회상하며 다시 한 번 치를 떨었다. “머리가 아무리 채근해도 발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중엔 손으로 발을 잡고 물속에 첫발을 담갔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흘러내린 양말을 발목까지 치켜 올려 신었다. “어릴 때 정확히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요. 아버지는 키가 컸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젖도 떼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얼굴은 기억하지 못해도 아마 나는 엄마를 많이 닮았나 봐요. 키가 작은걸 보면” 명확하지 않은 기억을 되짚다가 똑같은 장면의 필름을 되돌리면 한 번 더 각인 된 것처럼 선명해진다. 아니 원래의 기억에 자꾸 갖다 얹으니 마치 먼저 쓴 글자보다 새로 쓴 글자를 선명하게 보이려고 덧쓰기를 몇 번이나 하는 것처럼 기억도 그렇게 자꾸 덧입혀진 것이 실제인양 각인되기 마련이다. 그녀는 나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사실과 상상 속에서 연출 되어진 것들 사이에서 헤맬 때가 있다고 고백했다. 그럴 때 나는 그녀의 허망한 눈빛이 안타까워서 내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민망했다. 그녀가 남한에 와서 본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수면양말이라고 한다. 양말을 신고 잠이 들면 꿈을 꾸지 않아서 좋다고. 남한사람들은 양말을 꿰매신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 ‘내 양 엄마는 밤마다 식구들 양말 기우는 게 일이었거든요. 하도 여러번 천을 덧데어 기우니 발가락부분이 각각 다른 색깔로 기워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검은 양말에 흰색 실로 꿰매 누덕누덕 기워 놓은 것도 형제간에 서로 먼저 신은 사람이 임자이니 아침마다 양말 쟁탈전이 벌어진다고 했다. 말하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이 간다. 질이 좋지 않은 중국산 양말은 쉽게 구멍이 날것이고 여분으로 많이 마련해 두고 신을 형편이 되지 못하니 양말도 바쁘게 순번이 돌아갔을 것이다. “요즘엔 양말 꿰매 신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양말도 패션아이템이예요. 예쁘고 질 좋은 것으로 의상과 조화를 맞춰 신어야 돼요. 반바지에 수면양말은 너무 안 어울려요” 나는 입안을 맴돌고 있는 말을 내 뱉었다. 양말 속에 감춰진 그녀의 발을 보듬어 주고 싶다. 내 엄마가 젖가슴을 열어 데워준 것처럼 가슴으로 안아주고 싶다. 그녀의 작은 발이 압록강 차디찬 강물을 건너 왔으니 이제는 따뜻한 남쪽 대지에 어기찬 뿌리를 내릴 차례다. 수필가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